2025. 7. 15. 향토문화대학 유적답사에서 보고들은 필자의 느낀 소외(疏外)다
답사하고자 하는 유적지를 일일이 자세하게 해설한 안내장 기록으로 큰 줄기는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필자에게는 실타래처럼 의문은 계속되고 있다.
우선 대벌리 쌍조석간은 1749년 세워졌다. 높이 360cm 둘레 240cm의 규모다. 지금부터 276년 전 계화의 해변지역 마을에 평안과 안녕을 비는 마음으로 세워졌다. 30년을 1세(世)로 보면 9대 할아버지 때 생겨난 유적으로 볼 수 있다.
해변마을에서 해일이나 태풍과 재난을 만나지 않고 평안을 기원하고 자손만대의 번영을 비는 마음으로 쌍조석간을 세웠다고 생각한다.
동진강을 끼고 있는 동진강 주변 당하리에서는 어느 날 노인 한 분이 부안장을 보고 저녁 늦게 마을 앞에 와보니 마을 전체가 해일로 모두 쓸려나가 형체조차 없었다는 전설도 있다.
어쩌면 선조들은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의 공포 속에서 삶을 이어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마을 수호신을 민간신앙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당산(堂山)이라는 말이 부안지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당산이란 말이 어떤 경우 사용되는 것인지 질문하였다. 내소사에서는 매년 당산 놀이를 하고 있으며, 보안면 만화동마을에서도 정월 대보름날에는 당산제를 지내고 있다.
동진면에는 당(堂)상리 와 당(堂)하리 마을도 있다. 그러면 어딘가에 당(堂)이 있었을 것이다. 그 당(堂)집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아닌가?
당산(堂山)이란 말은 사전적 의미로 “토지나 마을의 수호신이 있다는 산이나 언덕-대개 마을 근처에 있음-을 이르는 말”이라고 한다. 어떤 연유로 이런 용어가 전래되고 있는 것인지?
당산(堂山)의 堂은 집이란 의미가 있는 집당(堂)이며, 시골집 큰 대청(大廳)을 의미하기도 한다. 고려-조선 때, 유명인의 문묘(文廟)와 거기에 속한 관립(官立)학교인 교궁(校宮)을 향(鄕)이라고 불렸다. 이는 계화면에 간제 선생님의 사당 계양사(繼陽祠) 옆에는 12개의 서당이 있었다. 이를 두고 향(鄕)이라고 칭한 것과 같다.
당산(堂山)이란 말은 삶의 현장에서 재난과 불안을 잠재우고 평화와 안녕을 주민들 모두가 기원하는 마음으로 수호신이 항상 돌보고 있다는 수호신 있는 곳을 당산이라고 칭하였다. 믿음이 있는 특정한 사물에 대하여 당산이란 용어를 주민 모두가 사용하는 것이라고 필자는 의미를 정의하였다.
현대에 사는 우리도 깊은 신념으로 어떤 일을 강력하게 추진할 때 마음속에 나를 보호하는 당산(堂山)이 하나 있다고 믿으며, 줄기차게 추진하는 당산이 하나씩 가질 필요가 있지 아니할까?
은빛방송단 김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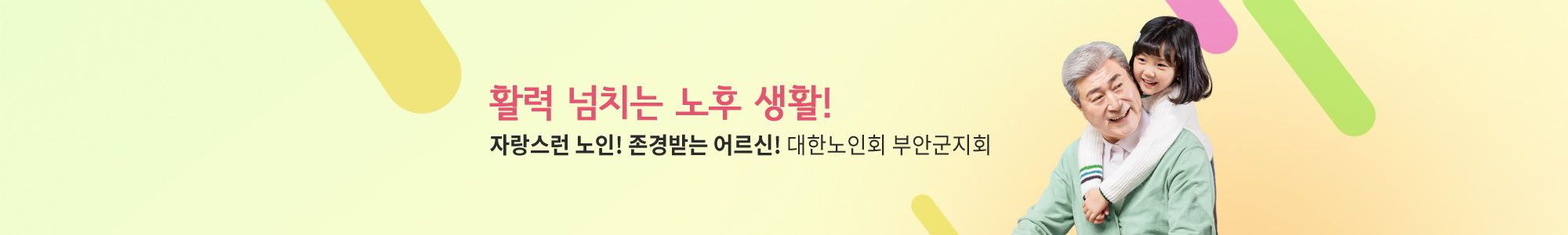
 소통마당
소통마당